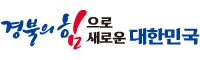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야사바랭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다”는 말로 유명하다.
음식이 사람을 닮아 가는 것인지? 사람이 음식을 닮아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음식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지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포항을 이해하는 데는 과메기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포항 전경]
겨울철이 제철이라, 싱싱 부는 엄동설한에 맞이하는 과메기는 비릿하면서도 쾨쾨한 내음, 기름이 잔뜩 낀 붉은 속살로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퉁명스러움에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김, 돌미역, 배춧잎에 과메기 한 토막을 고추장 듬뿍 발라, 쪽파, 마늘을 얹은 다음 입안에 구겨 넣으면 쫄깃쫄깃 씹히는 맛 속에 고소함이 입안으로 번져 나간다.
여운처럼 남아 있는 고소함을 찬 소주 한잔으로 마져 넘기면 기분 좋은 포만감이 몰려온다.

경상도 바다 사나이들의 무뚝뚝한 것 같으면서도 속정 깊은 마음과 같다고나 할까?
“됐다마 치아라”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고소함이 느껴진다.
과메기는 관목어에서 나온 말이다. 두 눈이 마주 뚫려 있는 고기의 눈을 꿰었다는 뜻으로 그 발음상의 변화를 거쳐 과메기가 되었다.
[소천소지]라는 조선시대 문헌에 보면 옛날 과거시험을 보러가던 배고픈 선비가 바닷가를 지날 때, 나뭇가지에 눈이 꿰어 말라가던 고기를 우연히 발견 했는데, 먹어보니 그 맛이 아주 훌륭했다고 한다. 선비는 그 맛을 잊지 못해 집으로 돌아와서는 겨울마다 청어나 꽁치를 나무에 꿰어 걸어 말려 먹었다.
여기에서 꽁치와 청어를 반쯤 말려 먹는 과메기가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60년대 이후 청어 산출량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꽁치 과메기만이 남았다.


우리나라 음식 중 말린 생선류를 날로 먹는 것은 드물다. 명태, 쥐치 등이 있지만 이들 생선은 거의 물기 없이 말려 먹는다 . 과메기처럼 축축하지 않다. 삭힌 것인지 썩힌 것인지 몰라 고민하는 홍어처럼, 과메기는 말린 것인지, 날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음식이다.
10월에서 2월말까지 덕장에서 과메기가 생산되는데 경북 동해안을 따라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최적의 조건을 지닌 구룡포가 대표지이다.
영하 10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속살이 투명한 붉은 빛으로 변한다.

통째로 말린 통말이와 반을 갈라 머리와 내장을 떼어낸 배지기로 나뉘는데 어민들은 통말이를 더 맛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맛엔 속까지 잘마른 배지기가 맞는다.
ps. 과메기는 계절 음식으로 포항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왠만한 횟집에서 다 맛을 볼 수 있다.